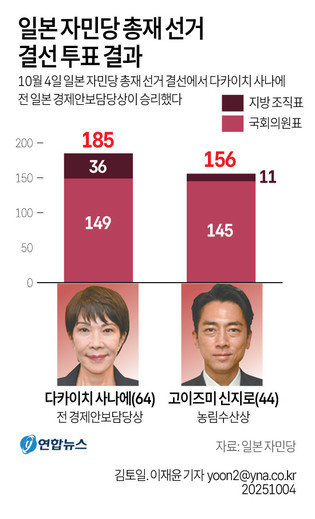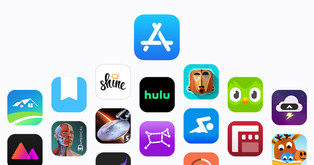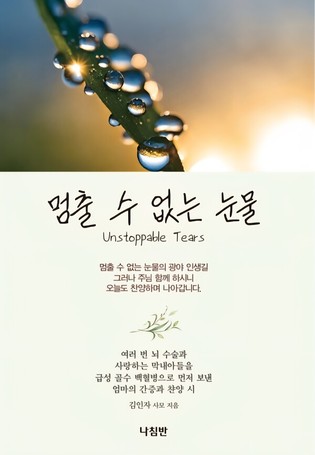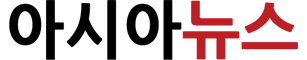[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강릉시립복지원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영동권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노숙인을 보호해온 이 시설이 60여 년 만에 증축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도시의 관점, 복지의 방식, 책임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2년 개소한 강릉시립복지원은 강릉뿐 아니라 속초·동해·삼척 등 영동권 전체에서 노숙인을 장기·단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로 기능해 왔다. 초기에는 단순한 보호 중심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르며 의료 지원·상담·요양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생활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 내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 기초 건강검진, 일상 생활교육 등을 꾸준히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왔다.
 |
| ▲사진=강릉시 |
문제는 시설이 1995년 이후 지어진 건물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25년 이상 노후화, 일부 동은 구조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영동권의 유일 시설이라는 사실은 노후화 문제가 지역 전체의 복지 인프라 붕괴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강릉시가 총 70억 원을 들여 기존 4개 동 가운데 2개 동을 철거하고, 2028년까지 지상 3층·1350㎡ 규모로 강릉시립복지원을 증축하기로 한 결정은 현실적·구조적 필요에서 비롯된 변화다. 무엇보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한파 같은 기후 위기, 경기 침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이 늘어났지만 기존 시설은 일시보호실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여서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새로 조성될 공간에는 이러한 돌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시보호실이 포함돼 긴급 보호 체계가 이전보다 한층 안정적으로 갖춰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기준 역시 증축의 중요한 배경이다. 감염병 시기를 지나며 노숙인 시설은 공동생활 공간을 넘어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립적 생활 공간, 감염 차단을 위한 구조적 설계, 강화된 위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노후 구조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결국 새로운 공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됐다.
여기에 노숙인 복지가 ‘보호 중심’에서 ‘회복·재활 중심’으로 전환된 시대적 흐름도 증축의 당위성을 키웠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직업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등 현대적 복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시설이 부족해 충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 증축은 면적 확장 뿐만 아니라 노숙인을 ‘되살리는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비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정책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간을 이루며 보호시설 운영, 재활·자립 프로그램, 의료·정신건강 지원, 거리 아웃리치 활동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거리 상담반과 야간 순찰을 운영하며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돕고, 동절기에는 응급 쉼터를 마련해 급박한 위험에 즉각 대응한다.
노숙인 정책의 중심이 ‘시설 안 보호’에서 ‘독립 생활 지원’으로 이동한 변화도 크다. 자활 시설과 임대주택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회복하도록 돕고, 자활근로와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사회 복귀 기반을 만든다. 또한 정신건강센터·중독관리센터·지역 병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건강 취약 계층 비율이 높은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렇듯 한국의 노숙인 지원 체계는 더 이상 잠자리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에 머물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설계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스스로의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강릉시립복지원의 증축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위에 놓여 있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저작권자ⓒ 아시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속초7.5℃
속초7.5℃ 북춘천8.7℃
북춘천8.7℃ 철원10.1℃
철원10.1℃ 동두천12.1℃
동두천12.1℃ 파주10.6℃
파주10.6℃ 대관령6.2℃
대관령6.2℃ 춘천9.7℃
춘천9.7℃ 백령도7.6℃
백령도7.6℃ 북강릉9.5℃
북강릉9.5℃ 강릉11.5℃
강릉11.5℃ 동해8.6℃
동해8.6℃ 서울12.7℃
서울12.7℃ 인천10.9℃
인천10.9℃ 원주10.6℃
원주10.6℃ 울릉도8.5℃
울릉도8.5℃ 수원10.9℃
수원10.9℃ 영월10.4℃
영월10.4℃ 충주11.0℃
충주11.0℃ 서산12.4℃
서산12.4℃ 울진9.0℃
울진9.0℃ 청주11.8℃
청주11.8℃ 대전12.4℃
대전12.4℃ 추풍령8.0℃
추풍령8.0℃ 안동9.3℃
안동9.3℃ 상주9.9℃
상주9.9℃ 포항10.2℃
포항10.2℃ 군산11.3℃
군산11.3℃ 대구10.3℃
대구10.3℃ 전주13.2℃
전주13.2℃ 울산9.9℃
울산9.9℃ 창원11.3℃
창원11.3℃ 광주12.8℃
광주12.8℃ 부산11.1℃
부산11.1℃ 통영10.9℃
통영10.9℃ 목포10.9℃
목포10.9℃ 여수10.4℃
여수10.4℃ 흑산도8.9℃
흑산도8.9℃ 완도12.2℃
완도12.2℃ 고창11.6℃
고창11.6℃ 순천12.2℃
순천12.2℃ 홍성11.5℃
홍성11.5℃ 서청주11.6℃
서청주11.6℃ 제주11.0℃
제주11.0℃ 고산11.4℃
고산11.4℃ 성산11.0℃
성산11.0℃ 서귀포14.0℃
서귀포14.0℃ 진주11.1℃
진주11.1℃ 강화9.9℃
강화9.9℃ 양평10.0℃
양평10.0℃ 이천10.9℃
이천10.9℃ 인제11.3℃
인제11.3℃ 홍천10.5℃
홍천10.5℃ 태백4.4℃
태백4.4℃ 정선군11.1℃
정선군11.1℃ 제천9.1℃
제천9.1℃ 보은9.5℃
보은9.5℃ 천안10.7℃
천안10.7℃ 보령11.6℃
보령11.6℃ 부여11.8℃
부여11.8℃ 금산11.8℃
금산11.8℃ 세종12.1℃
세종12.1℃ 부안11.3℃
부안11.3℃ 임실11.2℃
임실11.2℃ 정읍12.0℃
정읍12.0℃ 남원11.6℃
남원11.6℃ 장수8.9℃
장수8.9℃ 고창군11.5℃
고창군11.5℃ 영광군10.8℃
영광군10.8℃ 김해시11.6℃
김해시11.6℃ 순창군12.1℃
순창군12.1℃ 북창원11.6℃
북창원11.6℃ 양산시11.7℃
양산시11.7℃ 보성군13.6℃
보성군13.6℃ 강진군13.1℃
강진군13.1℃ 장흥13.1℃
장흥13.1℃ 해남13.6℃
해남13.6℃ 고흥11.8℃
고흥11.8℃ 의령군10.5℃
의령군10.5℃ 함양군10.4℃
함양군10.4℃ 광양시12.2℃
광양시12.2℃ 진도군12.1℃
진도군12.1℃ 봉화7.4℃
봉화7.4℃ 영주8.2℃
영주8.2℃ 문경9.5℃
문경9.5℃ 청송군9.2℃
청송군9.2℃ 영덕11.1℃
영덕11.1℃ 의성10.4℃
의성10.4℃ 구미9.5℃
구미9.5℃ 영천9.6℃
영천9.6℃ 경주시10.2℃
경주시10.2℃ 거창9.0℃
거창9.0℃ 합천11.2℃
합천11.2℃ 밀양12.1℃
밀양12.1℃ 산청9.7℃
산청9.7℃ 거제10.9℃
거제10.9℃ 남해10.0℃
남해10.0℃ 북부산11.7℃
북부산11.7℃